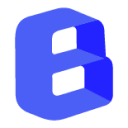경제학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우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경제학에 관한 진실)
조너선 앨드리드
경제학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이름하에 우리를 통제해온 경제학에 대한 놀라운 통찰!인간은 완벽한 합리성과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경제적 동물, ‘호모 에코노미쿠스’인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개념은 어떻게 발생했으며,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인류의 삶과 문화를...
이 책을 읽은 사람들
(이)가 주로 이 책을 읽었어요.